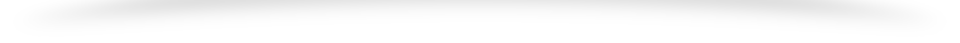마포 이태원 신당동은 집단 매장지였다
마포 이태원 신당동은 집단 매장지였다
부모님이 집 사라고 준 3억 세금 안내요 바뀌는 부동산 세금
서울의 동쪽 경계, 중랑구 망우리 공동묘지(현재 명칭 망우역사문화공원)는 삶과 죽음이 공존하는 희한한 지대다.
망우산 전체가 묘지로 가득 차 있지만, 평일에도 산책하는 사람, 등산객, 심지어 아이를 동반한 가족 나들이객들로 늘 북적인다.
모두들 아무렇지 않은 듯 무덤 사이를 활보하며, 심지어 묘역은 간식을 먹는 장소로 애용된다.
죽은자의 구역이 시민들이 즐겨찾는 도심공원으로 탈바꿈한 것이다.
망우리 공동묘지는 서울의 공동묘지로 사용되던 미아리 묘지가 포화조짐을 보이자 1933년 조성하기 시작해 1973년 매장이 금지되기까지 총 2만8500기의 분묘가 들어섰다.
이태원 제1묘지(이태원, 한남동 일원의 묘지)가 택지화하면서 3만7000여 기 분묘 가운데 무연고 묘가 화장돼
망우리 묘지에 합장됐고, 마포 노고산 공동묘지의 무연고 무덤도 합동으로 이곳으로 이장됐다.
오늘날 고급주택들이 즐비한 이태원·한남동, 서강대가 들어선 마포 노고산 주변이 불과 90년전 만 해도 집단 매장지였다는 사실이 놀랍다.
묘지는 죽음에 대한 부정적 인식, 공중위생, 미관상 이유 등으로 대표적 기피시설로 받아들여진다.
무덤은 되도록 주택에서 멀리 떨어져야 한다고 여겨지지만, 인구가 많고 땅은 좁은 서울의 경우 그럴 여건이 안됐다.
인구의 팽창일로 속에 가난한 도시 빈민들은 묘지를 터전으로 삼았고, 빈민촌과 뒤섞인 묘터는 다시 주택과 아파트 단지로 바뀌어갔다.
매장이 유일한 장례방식이었던 조선시대 한양은 무덤의 도시나 다름 없었다.
한양도성과 성저십리(城底十里·도성 밖 10리 내)는 묘지를 둘 수 없었지만, 국가통제가 느슨해지는 조선말기로 접어들며 금지법도 자연스럽게 풀렸다.
사람이 거주하지 않거나, 농사를 짓지 않는 마을 뒷산의 땅은 묘지가 빽빽하게 들어섰다.
묘지를 두고 벌어지는 산송(山訟)도 비일비재했다.
산 전체를 뒤덮은 묘지 모습은 외국인의 눈에 신기한 광경이었다.
주한 미국공사 호러스 알렌(1858~1932)은 <조선견문기(Things korean)>에서 “서울 주변의 벌거숭이 산에는 가난한
사람들의 무덤이 많이 있어서 마치 심하게 얽은 사람의 얼굴과도 같다”고 묘사했다.
프랑스 고고학자 에밀 부르다레(Emille Bourdaret·1874~1947)도 <대한제국 최후의 숨결(En Coree)>에서 “개간하지 않은 동산에 누구나 묘지를 마련할 수 있다.
정확한 묘표나 묘비가 없어도 자기 가족의 무덤을 찾아낸다”고 했다.
일제는 조선병합과 함께 시구개정(市區改正·경성시가지계획)을 통해 가로망 정비, 토지구획 정리 등 도시확대를 추진한다.
그 과정에서 도성 밖에 산재한 공동묘지가 계획추진에 큰 걸림돌로 작용했다.
조선총독부는 이에 따라 1912년 6월 20일 묘지사용을 통제하는 <묘지규칙>을 발표한다.
총독부가 인정한 공동묘지 외에는 사유지라 하더라도 묘지를 설치할 수 없고, 한국사회에서 금지됐던 화장을 합법화하는 내용이 골자였다.
이어, 1913년 9월 1일 ‘경성공동묘지 19개소’를 고시한다.
미아리(강북 미아), 신당리(중구 신당동), 이태원·한강(용산 이태원동, 한남동), 두모면 수철리(성동 금호동·옥수동)
연희(마포 연희동), 동교(마포 동교동), 만리현 봉학산(마포 아현동), 염동 쌍룡산(마포 염리동), 은평면 신사리(은평 신사동)는 이미
조선말 이후부터 광범위한 집단매장지가 있던 지역이다. 동대문 이문, 서대문 남가좌, 종로 평창, 여의도, 광진 능동도 19개 묘지에 포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