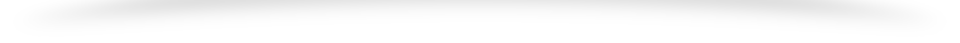건설현장 중대재해법 수렁 안전에 500억 더 써도 사고 여전
건설현장 중대재해법 수렁 안전에 500억 더 써도 사고 여전
대형 건설사인 A사는 2021년 수주한 울산의 한 공공발주 토목공사 현장의 안전관리비용을 최근 기존보다 50%가량 상향 배정했다.
중대재해처벌법 준수를 위한 위험성 평가 비용, 스마트 안전장비 도입 비용 및 안전인력 인건비가 예상보다 훨씬 컸기 때문이다.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주는 1년에 한 차례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통해 사업장의 유해·위험 요인을 파악하는 위험성 평가를 실시해야 한다.
그런데 공사 기간이 60개월로 긴 편에 속해 인건비 추가 지출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A사 안전관리 관계자는 “발주자가 시공사에 지급할 수 있는 안전관리비용의 상한선은 정해져 있는데,
실제 법을 준수하기 위해 들어가는 비용은 이 상한선을 훨씬 초과한다”고 말했다.
수도권 택지에서 공공분양 아파트를 건설 중인 중견 건설사 B사는 요즘 현장에서 흔하게 고용되는 안전감시단을 한 명도 두지 못했다.
해당 현장 안전팀장은 “월 300만원이던 감시인력 인건비가 중대재해법 이후 100만원 올랐다.
공사대금에 포함된 안전관리비용(산업안전보건관리비)은 22억원인데, 실제로 투입되는 안전관리비용을 계산해보니 30억원 넘게 책정됐다”며
“다수의 감시단을 두느니 안전관리자를 한 명 더 투입하는 게 낫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중대재해법이 시행된 지 1년6개월이 지난 현재 건설 현장에선 안전관리비용과의 사투가 이어지고 있다.
사업주 강력 처벌과 징벌적 손해배상으로 이어지는 법 적용을 피하기 위해 건설사는
발주처에서 지급받는 안전관리비용에 수억 원씩을 더 들여가며 만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그러나 처벌을 피하기 위한 노력이 고스란히 업체 부담으로 전가되면서, 안전관리비용은 업계에 ‘투자’보다 ‘손실’로 작용하고 있다.
법 시행 1년 반 동안 건설 현장 사망사고는 전혀 줄어들지 않았으며 실효성 논란도 여전하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1분기 상위 100대 건설사의 전국 건설 현장에서 발생한 사망사고는 55건으로,
중대재해법 시행 1년 전인 2021년 1분기(49건)보다 오히려 늘어났다.
윤석열 대통령이 중대재해법을 ‘킬러규제’ 중 하나로 지목한 뒤 보완대책을 지시한 이유도 이 같은 논란을 반영했기 때문이다.
추가 비용은 주로 인건비다. 대다수 대형 건설사는 혹시 모를 사고에 따른 처벌을 피하기 위해 안전관리자를 법적 기준 이상으로 고용하고 있다.
B사 현장은 법적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외에 추가 투입된 8억원 중 6억원이 인건비다.
이 현장 관계자는 “법 시행 이후 안전 관련 인건비만 약 40%가 올랐다”며 “고용을 늘려서이기도 하지만,
안전관리자 등의 몸값이 중대재해법 이후 치솟은 결과”라고 설명했다.
한 중견 건설업체 소속 안전관리자는 “5년 차 대리급 안전관리자 연봉이 중대재해법 시행 후 약 1000만원 급등했다”며
“20년 이상 경력의 안전관리자는 기본이 1억원”이라고 말했다.
대형 건설사 관계자는 “최근 건설 현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각종 안전·품질 사고의 배경엔 분명 공사비 부족 문제가 있다”며
“공사비가 적정하게 반영돼야 품질뿐만 아니라 안전사고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발주처는 현장 안전을 관리하는 데 쓰도록 시공사에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지급하도록 돼 있다.
건설공사 계약 시 발주처는 법정요율에 따라 공사금액의 일정 비율을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제공한다.
이 법정요율은 1.86%(5억원 이상~50억원 미만 일반 건설공사 기준)다.
문제는 중대재해법 시행 이후 이 금액으로는 도저히 안전관리비용을 충당할 수 없게 됐다는 점이다.
A건설사가 법 시행 이후 올 상반기까지 안전관리자 등 관련 인력 추가 고용, 스마트 장비 도입,
안전시설물 추가 설치 등으로 법정 지급액 외에 추가 투입한 안전관리비용은 총 500억원에 달한다.
현장 200곳에서 평균 약 2억5000만원씩 소요된 결과다. 이 비용은 고스란히 건설사가 떠안았다.
이 같은 어려움에 최근 건설업계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올려달라고 정부에 건의했다.